| 悩みの祭り Festival of Pain 고통의 축제 |
요즈음 친구들로부터 선물을 받는 기쁨을 여러 차례 누렸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지요.
아끼던 연필 모양의 샤프펜슬을 잃어버려서 은근히 속상했는데 얼마전 친구가 샤프펜슬을 사주더군요.
연필 모양의 것은 아니었지만 육각의 나무로 되어있어서 손가락에 닿는 느낌이 무척 좋았습니다.
'출력소'에 들렸더니 가방 메이커인 크럼플러(Crumpler)에서 나온 모자를 제게 선물해주었습니다.
"가장 어울리는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면서 그 사람이 바로 저라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모자 챙의 연두색 가장자리만 봐도, 같은 색의 자켓을 입은 그가 더 어울린다는 것은 당연했거든요. | 
Crumpler Cap |

Coldplay
Parachutes
2000-07-10
track 01
Don't Panic | Don't Panic
Oh, we're sinking like stones,
All that we fought for,
All those places we've gone,
All of us are done for.
We live in a beautiful world,
Yeah we do, yeah we do,
We live in a beautiful world,
Oh, we're sinking like stones,
All that we fought for,
All those places we've gone,
All of us are done for. |
We live in a beautiful world,
Yeah we do, yeah we do,
We live in a beautiful world.
Oh, all that I know,
There's nothing here to run from,
And there, everybody here's got somebody to lean on.
bass : Guy Berryman
guitar : Jon Buckland
drums : Will Champion
vocals : Chris Martin |
|
흔히 브릿팝(BritPop)이라고 부르는 장르의 음악 중에서 저는 Oasis와 Radiohead를 좋아하는데
어느날 Coldplay의 Don't Panic을 접하고는 이 밴드도 마음에 딱 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아마 제가「Coldplay, 그거, 괜찮더라」라고 했었나 봅니다.
정작 저는 그 느낌을 잊고 지나쳤는데 친구는 잊지 않고 기억해두었다가 CD를 건네주더군요.
지하철을 타고 해운대로 돌아오면서 CD의 비닐을 벗겨내고 부클릿을 뒤적거렸습니다.
괜히 미안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척 고마워서 저도 몰래 혼자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 
Coldplay |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문방구 욕심만 잔뜩 있다고 제게 핀잔을 주면서도 슬그머니 샤프펜슬을 사주는 그 친구의 마음에는,
그리고 굳이 제가 가장 어울린다고 말해주면서 모자를 건네주는 그 친구의 마음에는, 제게는 모자란「무엇」이 있습니다.
Coldplay 앨범 전부를 사줄 수는 없고 이것 한장만, 이라고 농을 치며 CD를 선물하는 그 친구의 마음에도 있을 그「무엇」. |
비록 저는 그들처럼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지만, 그리고 얼마전 스님에게 들은 것처럼 저는 '심장에 화(火)가 가득차 있다'지만
여유로운 마음의 그들이 제 곁에 있기에, 그런 그들이 저의 곁에 있음을 떠올리면, 제 마음까지 넉넉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We live in a beautiful world. |
|
생각해보니,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듯 싶은데.. 다시 얼굴보고 얘기하자니 괜히 쑥스럽군요.
지금이라도 '고맙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낼까 합니다. 이미 며칠 지나버린 일들인지라, 메세지를 보고는 분명 생뚱맞다고 생각하겠지만.
샤프펜슬을 쥐고서 (방 안에서) 모자를 쓴 채, Coldplay의 Don't Panic을 들으면서 정현종의 고통의 축제를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제게는 없거나 모자란「무엇」을 지닌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보내기 직전의 편지를 읽어내리듯.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 |
고통의 축제
- 편지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생(生)의 기미(機微)를 안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이 기미지, 그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만나면 나는 당신에게 색(色) 쓰겠습니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시(空是). 색공지간(色空之間) 우리 인생. 말이 색이고 말이 공이지 그것의 실물감(實物感)은 얼마나 기막힌 것입니까. 당신에게 색(色) 쓰겠습니다. 당신한테 공(空)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지란 우리의 감정결사(感情結社)입니다. 비밀통로입니다.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식자(識者)처럼 생긴 불덩어리 공중에 타오르고 있다.
시민처럼 생긴 눈물덩어리 공중에 타오르고 있다.
불덩어리 눈물에 젖고 눈물덩어리 불타
불과 눈물은 서로 스며서 우리나라 사람 모양의 피가 되어
캄캄한 밤 공중에 솟아오른다.
한 시대가 가고 또 한 시대가 오도다, 라는
코러스가 이따금 침묵을 감싸고 있을 뿐이다. |  |
나는 감금(監禁)된 말로 편지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금된 말은 그 말이 지시하는 현상이 감금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나는 감금될 수 없는 말로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영원히. 나는 축제주의자(祝祭主義者)입니다. 그중에 고통의 축제가 가장 찬란합니다. 합창 소리 들립니다.「우리는 행복하다」(카뮈)고. 생의 기미를 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녕.
∼ 정현종의 시집 고통의 축제 中에서 |
| 아직 계절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3월은 멀었으니까요. 산중으로 들어가던 길에, 서울은「머리가 띵하게 차가운 날씨」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오늘보다 더 추울 거라고 하더군요. 추워진다고 하면 예전과 달리 이제는 조심스러워집니다. 마음 속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 ○○ ○○○ 시인은「만일 당신이 생의 기미를 안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생의 기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저도 알고 싶습니다. 노래 소리 들립니다.「We live in a beautiful world」라고. 저도 시인처럼 읖조려봅니다.「생의 기미를 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녕.」 |
| √ 음악 파일은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첨부되었을 뿐이며 일체의 상업적 목적은 없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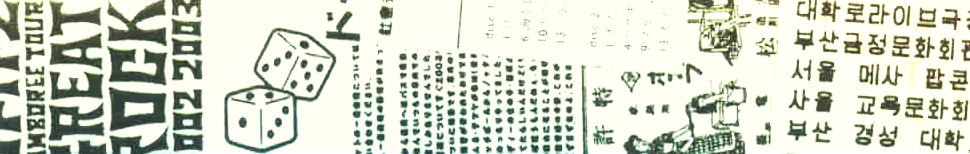
 | 관리자
| 관리자